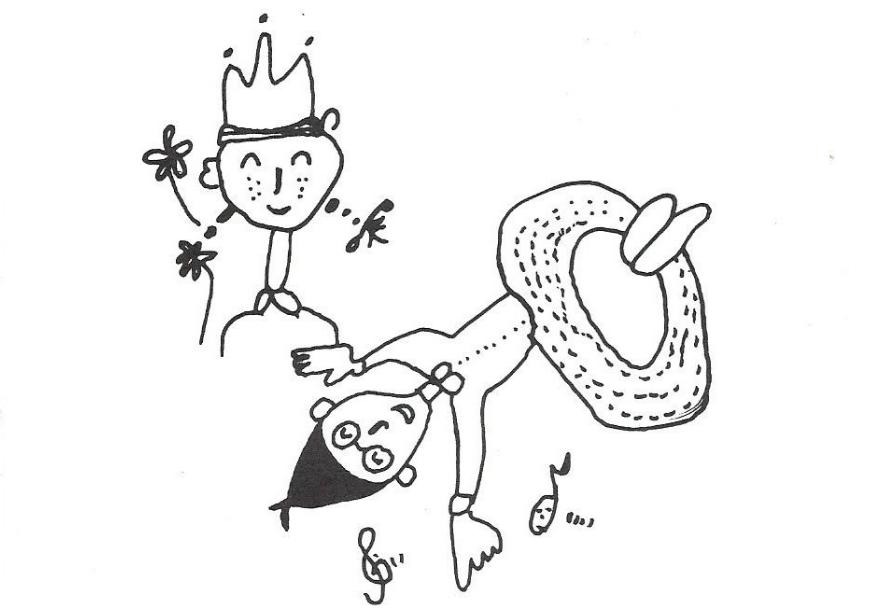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you live one life
질래 본문
찔래 꽃 필 무렵... 무성한 나무그늘이 그리워 지는 날... 아카시아 만개한 산 입구에 찔래 꽃이 군데군데 피어 있다. 하얗게 눈처럼 떨어진 아카시아 나무 사이에 나즈막한
찔래 나무에는 시골 처녀 미소 같은
하얀 찔래 꽃이 피었다.
장미처럼 가시를 세워도 장미의 화려함에 비할 수 없는
그저 작고 보잘 것 없는 찔래 꽃... 찔래 꽃을 참 좋아 한다. 그 찔래 꽃 속에 나의 유년의 추억이 숨어 있어서, 난 찔래 꽃 필 무렵이면 한차례
또 아련한 추억속에 젖어 든다. 어린시절 학교길에 찔래 덤불
해치며 여린 찔래 순 한 줌 꺽어서 껍질 죽~죽~~벗겨서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우던 시절... 쌉쌀함과 시원함이
입 안 가득 번져올때,
느꼈던 그 잠깐의 포만감...
나무가 튼튼하여 찔래 새순이 통통한 것은 서로 꺽으러 책보자기 허리에 묶고 뛰어가
정신 없이 꺽었다. 혓바닥이 시퍼렇게 되도록 먹었다. 지나가던 어른들께선 찔래 많이 먹으면 코에서
뱀 나온다고 한마디 던지고 가면 괜히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코를 만져 보기도 했던 그 시절... 예전 생각에 이리 저리 새순을
찾아 봐도 찔래 순은 쇠어 버려서 하얀 꽃잎 몇개 입속에 넣어 보니 이젠 변해버린 입맛에 그저 씁쓸한 맛이 입안 가득 번집다... 먹을 것이 귀했던 그때는
찔래 꽃잎도 한웅큼씩 따서 먹었다.
미루나무 길게 그림자 만들때 허기진 배 달래며 꺽어 먹었던 찔래, 먹을것이 귀했던
시절 우리들의 군것질꺼리들... 봄엔 진달래 꽃잎부터
시작해서 찔래 꺽어 먹고, 여름이 되면 어린 소나무 꺽어서 껍질 벗기고 속살 벗겨 먹고...
가을이 오면 그야 말로
먹을것이 풍성 해지는데, 머루,다래,보리둑,깨금도 있고... 날이 저물도록 들과 산으로 먹을것 찿아서 헤매고 다니던 그 때... 찔래 꽃 피는 시기엔 어린시절이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찔래 꽃 필 무렵을 기다리면서 진달래는 ‘참꽃’이라고도 합니다. 이른 봄 개나리와 함께
온 산을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진달래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추억에
잠기게 되는 참으로 ‘신기한’ 꽃입니다 꽃 중에 제일 맛있는 것은 ‘아카시아 꽃’이라고 장담합니다.
5월이 되면 동구 밖의 아카시아 나무에서 풍겨나오는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찌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아카시아는 나름대로 열심히 따먹지만 키가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누나나 형들을 졸라 따 먹곤합니다.
아카시아는 꽃을 하나하나 따 먹는 것이 아니고, 꽃송이 하나 전체를 손이나 입으로 쭉 훑어서 입 한 가득 넣고 씹어야 재 맛이납니다.
아카시아 꽃의 진수를 한번 보려면 꽃이 피는 때 대구 앞산공원 산책로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찔래 새순도 봄에 많이 먹는 간식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봄에 갓 자란 연한 찔래 새순의 껍질을 벗긴 후 오독오독 씹어 먹습니다.
어린시절 뒷동산 무덤가에서 삘기를 뽑아 먹은 기억들이 불현듯 떠오른다.삘기는 띠풀의 새 순인데 그 것을 뽑아 먹으면 달콤한 맛이 있었다.
배부르지도 않은 삘기를 뽑아 단맛만 취하고는 망설임 없이 버리곤 했었다
삘기를 뽑아 단물을 빨아먹는 맛은 사탕보다 달고 맛있어요. 삘기는 볏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풀인 띠의 어린 꽃이삭이에요
. 삘기는 무리지어 자라므로 있는 곳만 찾으면 단물을 맘껏 먹을 수 있어요
봄이면 개구리 알 잡던 웅덩이, 버들피리 틀어 불던 갯버들,영롱한 이슬 머금고 막 피어나던 붓꽃 핀 강변길이 아스라히 잡힐 듯 하다.
껌 대신 씹던 삘기, 사탕보다 새콤달콤했던 산딸기,
눈깔사탕 그리워 꿀풀을 꺾어 쪽쪽 빨아먹던
그 아름답던 봄날의 등하교 강변길에 오래도록 서 있고 싶다.
찔레나무가 새 순을 쭉쭉 뻗어 올리면 그 탐스럽고 보드라운 순을 꺾어서 아작아작 씹는다. 산에 가서는 물오른 송기(松肌)를 벗겨 먹었고 쑥을 캐다간 쑥국을 끓였다. 송기는 충분히 식량이 될 수 있어서 송기떡을 해서는 쑥국과 함께 몇 끼씩 때워 넘기기도 했었다.
삘기 먹고 강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철도를 건너야 했다. 우리는 또 철로에서도 한참씩 놀았다. 물오른 버들가지로 '촐래'라는 이름의 피리를 만들어 분다. 가끔씩 지나가는 기차가 우리들의 피리 소리를 삼켜버리면 무작정 기차를 향해 감자를 먹어대기도 했다.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기차 꼬리를 보며 선로에 귀를 대고 심장의 고동 같은 소리를 들어보려 했다. 그것은 우리들의 꿈이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꿈, 기차를 타로 어디론가 멀리 가보고 깊은 꿈이었다.
'플래닛 이전 > 아무거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안경쓴 얼굴을 그린다 (0) | 2009.07.20 |
|---|---|
| [스크랩] 뽕나무 열매, 오디 (0) | 2009.07.19 |
| 전기가 처음들어오던날 (0) | 2009.07.19 |
| [스크랩] 관옥 이현주목사님의 기도 (0) | 2009.07.19 |
| [스크랩] 유년의 밭 꽈리 - 양현경의 봉숭아 (0) | 2009.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