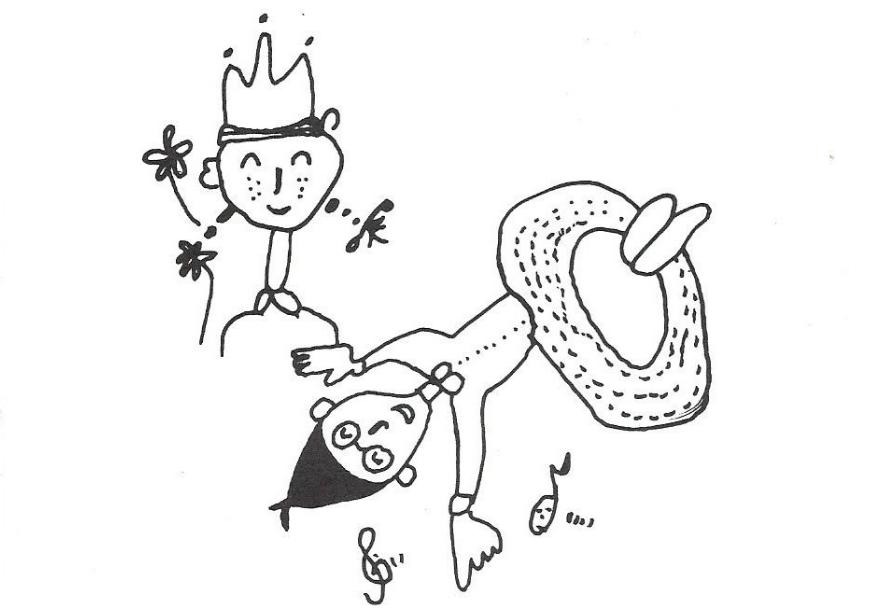you live one life
사랑이란 홍역과 같아서 나이 들어 걸리면 볼썽사나워진다 본문
|
그 풋풋하고 싱그럽던 시절이 정말 우리에게 있었던 것일까? 가지에 앉은 새만 봐도 웃음이 나고 뜨락에 핀 꽃만 봐도 한숨이 나던 그 아련한 날들이 우리에게 정말 있었던 것일까? ‘그 기쁜 산골 물소리’ 같던 첫사랑의 시간들은 정말 있었던 것일까? 그 시절 우리 가슴은 스펀지 같아서 사랑이라는 연한 초록물이 속절없이 스며들었었다. 그 시절의 우리 가슴은 힘주어 당긴 활줄 같아서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결에도 피융 피융 소리를 내며 떨리곤 했었다. 부정적 사랑의 정의(定意), 이를테면 ‘사랑의 신 에로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 비너스와 가장 흉측한 얼굴을 한 전쟁의 신 발칸에게서 태어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추악함도 함께 가지고 있다’ 라든가 ‘사랑이란 욕망의 강에 사는 악어일 뿐’ 이라든가 ‘사랑을 하면 간혹 현명해질 수 있지만 현명해지면 사랑을 할 수 없다’ 라든가 하는 불온한 사랑의 정의들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다. 유치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무모했지만 그지없이 순수했으므로 첫사랑의 시간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다. ‘순아 너는 언제 내 전(殿)에 들어왔던 것이냐’라는 윤동주의 시에서처럼 우리는 첫사랑을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을 추억의 성전(聖殿)에 남겨두는 것이다.
영국의 작가 K.제롬은 사랑은 홍역과 같아서 누구나 그걸 겪어야 하고 단 한 번만 겪는다(Love is like the measles ; we all have to go through it and we take it only once)고 했다. 큐피드는 같은 가슴에 화살을 두 번 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라면 홍역이란 주로 어릴 때 앓는 것이므로 그 단 한 번의 사랑은 첫사랑을 말하는 것이리라.
사랑이란 홍역과 같아서 나이 들어 걸리면 볼썽사나워진다는 오래된 서양 속담도 있는 터이다.
나이 서른에 벌써 ‘잔치는 끝났다’고 선언한 시인 최영미가 그 시를 읽고 모든 다른 시들을 잊고 싶었다고 토로했던 김기림의 시 ‘길’의 한 대목이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렇다. 우리 삶에서의 첫사랑은 길 위에서 주었다가 버린 돌멩이처럼 그 대상도 분명치 않고 오는지도 모르게 가버렸거나 아프지만 달착지근한 혼자사랑이었을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첫사랑의 역사는 불완전한 기억의 짝사랑의 역사인 것이다.
희미한 내 첫사랑의 기억도 그랬다. 하얀 얼굴에 눈이 크고 왼쪽 입가에(오른쪽이었던가?) 작은 점이 있던 그 여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시던 날 얌전을 부리시느라 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무릎을 손수건으로 가지런히 덮고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계셨고 수줍어 한 마디도 못하던 나는 손수건에 그려진 장미꽃들만 세고 있었다. 그 하얀 손수건을 수놓았던 장미꽃들의 수효(아홉 송이였다)와 식혜를 마시다 재채기를 해서 마주 앉은 어머니 얼굴을 온통 밥알로 뒤덮어 얼굴을 붉히며 쩔쩔매시던 모습까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다. 나도 그렇게 누군가의 가슴에 남은 첫사랑이었을까?
오스카 와일드가 그랬다. 남자는 언제나 여자의 첫사랑이 되려고 하고 여자는 늘 남자의 최후의 사랑이 되려고 한다고. 특히 남자들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오래 전 어느 작가의 콩트에서 읽은 이야기다.
오매불망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남자가 있었다. 술만 마시면 친구에게 그녀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토로하며 먼발치에서라도 꼭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러던 그가 언제부턴가 첫사랑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게 되었다. 그 연유를 묻는 친구에게 들려준 그의 사연인즉슨 이러했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다가 소변이 급해 화장실 문을 왈칵 열었더니 왼 여인이 황급히 아랫도리를 수습하며 일어나는데 바로 그 첫사랑이었다는 것이다. 첫사랑에 대한 아련하고 순수했던 환상이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린 순간이었다.
‘삼십년 쯤 되었을까, 정동진을 지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내 느낌은 그저 적막하다는 것, 비둘기호 열차가 '라면'이라는 붉은 글씨가 쓰여 있는 나무 판대기가 바닷바람에 덜컹거리는 주막 옆을 지날 때는 더 쓸쓸해 보인다는 것, 그 뿐이었습니다. 그 쓸쓸하고 적막한 해변의 모래톱에 흐뭇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다시 정동진을 가보았는데 그 아름답던 해변에 도시 한 복판의 자본주의를 한 삽 폭 떠다 부어놓은 모습이라니. 내 기억 속의 아름다운 곳 하나를, 두고두고 그리워할 수 있는 곳 하나를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길이 허전했습니다.’
그렇다 세상에는 아무리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 않은 곳 하나쯤은 남아 있어야 하고 그게 첫사랑이 있는 그곳일지 모른다. 남자들이여, 행여 첫사랑을 만나려 하지 말라!
새라 티즈데일의 시다. ‘나는 첫사랑에게 웃음을 주었고 두 번째 사랑에게는 눈물을, 마지막 사랑에게는 깊고 깊은 침묵을 주었다네’ 우리는 그게 눈물이든 웃음이든 깊고 깊은 침묵이든 서로 주고받아야만 살아지는(‘살아가는’이 아니라) 것인가?
Flower Greetings - Thomas Schweizer 기다리고 있는 걸 왜 모르겠소. | ||||||
'일상 > 일상에서의 느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치복음밥을 해봤다. (0) | 2014.06.09 |
|---|---|
| 기죽어서~ (0) | 2014.05.23 |
| "구원파 신도들, 교주 유병언 위해 폭력 불사할 것"-생각들이 이렇게 다를까? (0) | 2014.05.16 |
| 웃자! (0) | 2014.05.12 |
| 아~ (0) | 201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