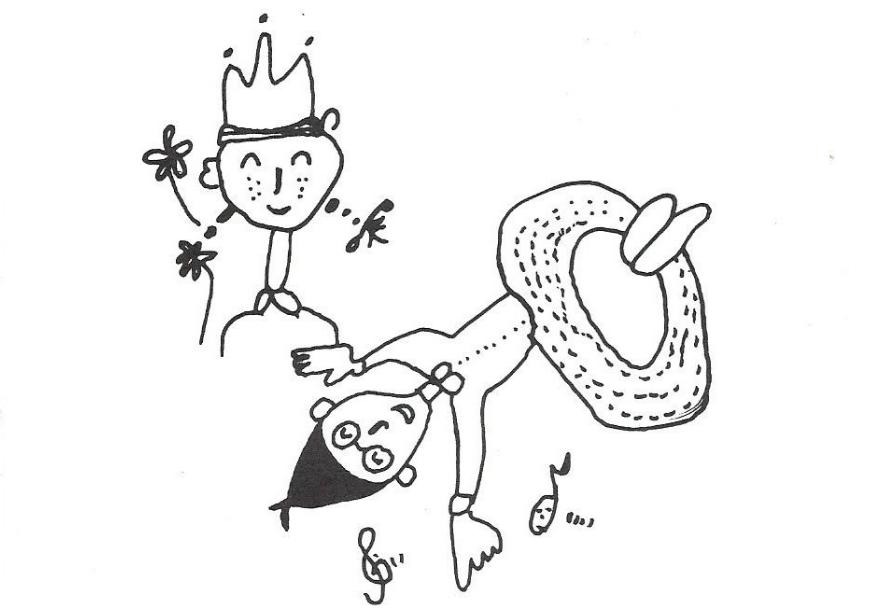you live one life
그래.. 내게도 풋사랑이 있었지? 본문
그래.. 내게도 풋사랑이 있었지?
그게 언제드라?
맞아, 초등학교적였어.
말꼬랑지같이 걸을 때마다 찰랑대는 말총머리
2학년 아홉살짜리 소녀였어.
서울에서 전학왔다는 그 계집아이는
참으로 뽀얗고 앙징스러웠더랬어.
난 그 아이가 또래 계집아이들과
깡총거리며 고무줄 놀이를 하는 모양을
멍청히 바라보기만 하는 숙기없는 촌놈였어.
나는 동무들이 고무줄을 끊어 달아나곤하는 것이
그쯤에서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
그 아이는 속눈썹이 유달리 길었어.
눈은 또 얼마나 예뻤다구?
나는 아침이면 그 아이를 만나려고
책보를 쌌던거 같애.
어느날은 필통을 빼놓고 학교에 온 날도 있었어.
몽당연필만 들었던 필통였지만
걸으면 달그락!~ 달그락!~ 양철소리가
꽤나 시끄러웠던 필통였는데
그 아이가 전학오고 난 뒤로는
도통 그 양철소리가 안들렸어.
쬐끄만 내 참새가슴에서 들리는 콩닥이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더랬어.
난 결심했어.
그 아이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처음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로 말이야.
작은누야의 가느다란 검정색 실핀였어.
두개를 주먹에 꼭말아 쥐고는
핀을 못찾아 쩔쩔매는 작은누야를 모르는
척 냉정히 외면하고는 학교길로 달음박 쳤어.
그 날은 구구단의 5×단을 외우는 날이였어.
난 평소 구구단은 자신이 있었어.
권오정선생님이 아버지와 친구사이라서
우리집에 자주 오셔서 아버지와 막걸리를 자주 마시기 때문에
난 아버지께 꾸중을 안들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어.
특히 5단은 5씩 더하기만 해서 특히나 쉬운 단였어.
헌데 그아인 끝까지 못외우고 얼굴이 사과빛으로 볼그스레했어.
고개를 푹 숙이며 울먹울먹하는
그 아이가 어찌나 가여웠는지 몰라.
내 차례가 왔어.
난 일부러 중간에서 멈칫거리며 뒷머리만 극적댔어.
나도 그 아이와 마찬가지로 나머지공부를 해야했고
유리창도 닦아야했어.
아침도 안먹고 머리핀만 챙겨 달아나다시피 온
배는 꼬르륵!~ 거렸지만
그게 뭐 대수야?
난 내게 할당된 유리창을 후딱! 닦아치우고
그 아이의 유리창으로갔어.
그 아이는 반도 못닦고 힘들어 했어.
난 내 소매깃으로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쓱쓱!~ 닦아나갔어.
그 아이는 눈만 크게 뜨고 바라만봤어.
나는 옷소매가 시커멓게 돼서
분명 엄니에게 혼꾸녁이 날 껄 번연히 알면서도
양소매를 다 동원해서 닦아줬어.
내내 그 아이에게 건내줄 머리핀은 한쪽
주먹에다 꼭 쥔 채로 말이야.
하지만 안받으면 어쩌나
자기도 있다고 도로 내밀면 또 어쩌나.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갔어.
선생님이 유리창 검사를 오셨어.
그 아이는 당연히 합격을 받았어.
내 차례가 왔어.
난 합격대신 꿀밤을 맞았어.
그 아이는 책보자기가 아닌 예쁜 가방을 들고 다녔어.
드르륵!~ 교실문을 나가는 그 아이에게 잠깐!~ 하는 소리가
목구녕에서 나오려다 말았어.
참으로 야속했어.
얼른 잽싸게 닦아놓고 다시 검사를 받았어.
책보를 옆구리에 끼고 냅다 학교뒤 언덕길을 뛰어 올라가
마르택이쪽을 바라봤어.
벌써 그 아이는 수실말로 갈라지는 논둑길로 접어 들었어.
괜히 눈물이 핑하니 돌았어.
마구 달렸어.
갈림길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마르택이쪽만 멍하니 바라봤어.
땀에 쩔은 손아귀에서 실핀이 스르르.. 삐져나와
풀섶에 떨어졌어.
그게 내 풋사랑의 기억이야.
끝내 머리실핀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 아이는 며칠후 엄마가 있다는 서울로 다시 전학간다고 했어.
마르택이는 그 아이 외갓집였데.
나는 그 아이가 교탁 앞에서 작별인사를 할때
애꿎은 책상 구석댕이만 손톱으로 막 긁어댔어.
그게 그 아이와의 전부였어.
채 두어달도 못되는 짧은 스쳐지남.
그것이 전부였어.
내 가슴속에 잠시 머물다가 바람이 스쳐지나가듯 떠난
그 아이를 종종 생각하곤 했어.
나중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교과서에서 <소나기>를 배우며
며칠을 내내 그 아이를 생각했어.
몇번을 읽었는지 몰라.
쇠꼴을 먹이러 나가서도 읽고
고봉장둥 높은봉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읽기도 했더랬어.
얼굴이 뽀얗고 말총머리 찰랑거리던 그 아이.
채 익지않은 풋사과같은 풋사랑.
그 아이 이름은 김순란이야.
지금도
영영
소식을 몰라.
http://blog.chosun.com/glassy777/7305693
어느 블로거의 풋풋한 첫사랑의 고백을 들어 본다.
난 이글을 읽으면서 옛 국민학교 시절로 훌쩍 돌아간듯한 착각에 빠졌다.
나도 비스무레한 추억이 나풀거리며 떠오르니.
그래서 추억은 아름다운가 보다.
언젠가 아주 세월이 더 많이 흐른후 나도 이런 고백아닌 고백을 읊조릴날이 오겠지.
말총머리 찰랑거리던.....
'잡동사니 > 퍼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최근 판도라TV(www.pandora.tv)에 물 위를 걷는 남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돼 화제다. (0) | 2013.02.16 |
|---|---|
| 밥은 먹고 다니냐? (0) | 2013.02.16 |
| 어느참전 용사의 라이터에 새겨진 있는 글이라는데... (0) | 2012.09.07 |
| 하루를 살기 위해 천일을 기다린 하루살이 (0) | 2012.07.27 |
| 관 속에 6일 간 누워 있다가 '부활'한 중국의 90대 노인 (0) | 2012.07.20 |